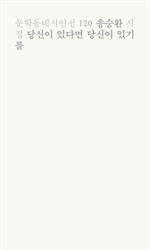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 (문학동네시인선 120)
- 저자
- 송승환
- 출판사
- 문학동네
- 출판일
- 2019-06-21
- 등록일
- 2019-09-2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나는 언어 속에 있고 언어 속에 없다”
우연히, 기어이, 마침내, 간신히, 그토록, 기꺼이
물결치는 밤, 백지라는 무덤에서 솟아나는 흐느낌
문학동네 시인선 120번째 시집으로 송승환 시인의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을 펴낸다. 2003년 『문학동네』 신인상에 시가, 2005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에 평론이 당선되면서 시문학의 신실한 연구자이자, 끊임없는 자기 갱신으로 한국 시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해온 시인 송승환. 그가 두번째 시집 『클로로포름』 이후 팔 년 만에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을 내어놓는다. 시인이 가까스로 부려놓은 투명하고도 긴장감 가득한 시편들은 우리들의 오감을, 아니 차라리 육감(六感)이거나 감각할 수 없는 감각들을 일깨우고, 빈틈없는 무의미와 빼곡한 여백의 세계로 초대한다.
그간 시인이 펼쳐낸 책의 ‘시인의 말’을 엮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바라본다(『드라이아이스』)―들린다(『클로로포름』)―나는 있는다(『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 각기 수년간의 시차를 두고 다가온 문장이지만, 이는 시를 감각하는 시인의 지금을 설명해줄 단 한 문장 같기도 하다. 바라본다, 들린다, 나는 있는다. 시의 시작은 시(視)에 있고, 애써 듣는 것이 아닌 ‘들린다’는 무한한 열림, 그리하여 문학의 공간에 있는 나. 휘발성 강하고 지워지는 글쓰기를 떠오르게 하는 전작의 제목들과 같고도 다르게, 그의 이번 시집은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이라는 문장으로 독자들을 맞이한다.
시집의 전체 구성은 ‘만약-어쩌면-아마도’로 이어져 있다. ‘나뉘어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이유는 이 한 권의 시집 첫 페이지에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감히 분절할 수 없는 한 편의 시이기 때문일 터. 우리가 백지의 앞면과 뒷면을 구별할 수 없듯, 시인의 체에 걸러진 순결하고 깨끗한 언어는 시작과 끝, 앞과 뒤, 입구와 출구가 모두 무의미해지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나는 있는다’의 삼위일체 ‘만약-어쩌면-아마도’에서 뭔가 윽박지르는 듯했던 시집 제목이, 말이 제대로 되는 한 최대로 길어지는 문장의 대미를 당당하게 장식하는 차원에 가까스로 달한 것이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이야기의 장식 아니라 원인이고 문법인 시(詩)다.
(…)
그뒤의 모든 시들이 그렇게 열린 공간에서 겨우겨우 가능한 표현들이지만 또한 그렇게 자유자재할 수가 없다. 이번 시집에서 그는 마침내 기를 쓰고 새롭다. 내가 보기에 그는 아무도 가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가고 싶지 않았던 길로 들어섰다. 시를 다시 읽고 다시 목차를 읽으면 미궁인 원인-문법들의 잘 짜인 장시로 읽힐 만하다.
_김정환(시인), 해설 「론 없는 서-본-결」부분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다”
투명한 눈물색 잉크로 쓰인 빛나는 시편
맑고도 순정한 눈으로 지어낸 시편들은 어쩌면 가장 순수한 말하기인 읊조림, 속삭임을 떠오르게 하고 이는 ‘흐느낌’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송승환의 이번 시집에 넓고도 옅게 깔린 슬픔과 애도의 기운은 때로는 ‘무덤’으로 때로는 ‘욕조’로 형상화된다. 롤랑 바르트가 낙담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쓴 단어 마리나드(Marinade)―푹 잠기고 절여진 상태―를 상상해보자면 욕조에 서서히 가라앉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애도 일기』를 시로 썼다면 마치 「병풍」과 「욕조」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내가 욕조 속으로 누울 때
욕실 주위로 검은 옷들이 흩어져 끌려나온다
내가 바라보지 않을 때
어머니는 드러나지 않고 나타난다
달
핏물이 번져간다
(…)
욕조
빨려들어가는 물소리에 내맡겨진 욕조
속에 나는 가라앉는다 뭍이 멀어진다 또다른 뭍이 다가온다 섬과 섬을 휘감고 돌아나가는 푸르고 검은 바다 바닥에 부딪힌다 구멍을 치고 들어왔다 빠져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부서지는 포말 속에 손가락을 담근다 욕조는 방향을 바꾼다 나는 어디에 있다 잊는다
_「욕조」 부분
사라지고 나타나고, 떠오르고 가라앉고, 있고 없고, 빼곡하고 비어 있고. 이런 가변성과 운동성 속에서 송승환식 메타포와 탈바꿈(metamorphosis)의 공간이 탄생한다.
나는 남성이면서 시인이고 시인이면서 여성이다
나는 바이올린이고 클라리넷이고 심벌즈이고
나는 나비이고 새이고 풀이고 사슴이다
(…)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다
_「플라스틱」 부분
그의 이번 시집을 투명한 눈물색 잉크로 쓰인 시편들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집의 제목이 몹시 슬픈 기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세계의 밤에 내던져진’(「B102」) 것만 같은 나날에 쓰인 시. 흐르고 흘러들 뿐인 세계에 대한 깊은 슬픔이 소금처럼 흩어져 있는 시. ‘빙하의 밤 심해의 쇄빙선 안에 갇혀’(「검은 돌 흰 돌」) 쓰인 것만 같은 시. 그럼에도 그 세계에서 ‘그러나 조금 굉장히 가까스로’(「이화장」) 지그시 바라보고―들리고―있음으로 쓴 시. ‘밤의 미광’(「검은 돌 흰 돌」)과 ‘돌연 빛이 나를 비추’(「있다」) 는 것을 감각하는 시. 그 빛은 백지를 닮아 고요한 아침의 모습으로 다가옴을 예감하게 하는 시.
‘시’라는 한 글자로 말해지는 지극함,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시라는 정수, 언어 예술의 극한을 독자들은 이번 그의 시집에서 경험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한하고도 빼곡한 여백, 칠흑으로 뒤덮인 텅 빈 밤이 데려다놓는 무한이자 문학의 공간. 그리하여 그곳에, 돌연―너는―나는, 만약―어쩌면―아마도,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
■ 시인의 말
나는 있는다
2019년 5월
송승환
■ 책 속에서
당신이 있다면 당신이 있기를 그친다면 당신이 드러난다면 마침내 당신이 밝혀진다면 이름은 부서져서 이름들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어도 이른바 이제껏 허투루 이토록 한층 한달음에 함께 여름에 겨울에 남으로 북으로 좀처럼 자주 바닥으로 창공으로 바람으로 눈으로 영원히 절대로 가령 깊숙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를테면 솟구치듯 불쑥 마치 오히려 한결같이 완전히 헛되이 가까이 아니면 이윽고 그것뿐인 양 마치 아무것도 어떤 것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송두리째 봐란듯이 숫제 똑같이 아니 여기에 거기에 이미 살며시 밤마다 온전히 언제나 그러나 전혀 어쩌면 예외로 대부분 아마도 그처럼 그토록 텅 텅 그토록 그처럼 아마도 대부분 텅 텅 당신이 걸어나간다면 끝까지 예외로 어쩌면 전혀 그러나 언제나 온전히 밤마다 살며시 이미 거기에 여기에 아니 똑같이 덜하지도 더하지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마치 그것뿐인 양 이윽고 아니면 가까이 완전히 한결같이 오히려 마치 불쑥 솟구치듯 마침내 당신이 밝혀진다면
_「심우장尋牛莊」 전문
1
이름
빈 무덤
어머니가 없다
2
솜으로 귀와 코를 막는다 눈을 감기고 턱을 받치고 입을 닫는다 머리를 높이 괸다 손발을 주무르고 몸을 눕힌다 백지로 얼굴을 덮는다 배 위에 왼손 오른손 올려놓는다 받침대로 옮기고 홑이불로 덮는다 병풍으로 가린다
향나무 삶은 물로 씻긴다 머리 빗질을 한다 자른 머리카락 깎은 손톱 발톱 주머니에 넣는다 이불에 넣는다 물 수건빗 마당에 묻는다 몸을 관에 눕힌다 몸과 관 사이 메운다 문을 닫는다 나무못을 박는다 관을 묶는다 병풍으로 가린다
묘지 네 모서리 말뚝 아래 관이 내려간다
어머니가 있다
3
어머니가 없다 부를 것인가
어머니가 있다 부를 것인가
_「병풍」 전문
나는 팽창하면서 수축하고 폭발하면서 압축하고 펼쳐졌다 뭉개지고 쓰러졌다 일어서고
나는 물이고 불이고 흙이고 공기고 물이면서 불이고 불이면서 흙이고 흙이면서 공기다
나는 세계의 핵과 전자다
나는 늙고 젊으며 젊고 슬기로우며 슬기롭고 어리석다
나는 이주 노동자 여성이고 비정규직 남성 노동자다
나는 침몰하는 배에 갇힌 소년이고 탄창을 손에 쥔 사무원이고 전단지 뿌리는 학생이고 곡괭이 든 의사이고 펜을 든 농민이고 크레인 운전하는 교수이고 갱도 끝 광부다
_「플라스틱」 부분
[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