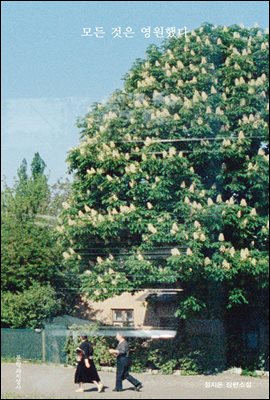
모든 것은 영원했다
- 저자
- 정지돈 저
- 출판사
- 문학과지성사
- 출판일
- 2021-05-10
- 등록일
- 2023-01-0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6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이 소설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언이다”
어제를 보여주는 미래의 책 또는 오늘을 사유하는 어제의 책
인용과 질문과 농담과 아이러니로 연결되는
정지돈이라는 소설
문지문학상,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 작가 정지돈의 장편소설 『모든 것은 영원했다』가 출간되었다. 다양한 장르를 끌어들여 소설의 지평을 확장시켜온 정지돈은 첫 책 『내가 싸우듯이』부터 최근작 『농담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흡수한 텍스트에서 사실을 차용해 새로운 글로 탄생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모든 것은 영원했다』는 한때 미국 스파이로 오인 받던 공산주의자 현앨리스의 아들인 실존 인물 ‘정웰링턴’의 삶을 주축으로 삼는다. 정지돈은 건조한 정보에 풍부한 허구를 뒤섞고 필연과 우연, 회의와 믿음을 오가는 진지한 담론에 실없는 농담을 교차시키면서 정웰링턴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면을 내어준다. 흩어져 있던 이미지, 자료와 텍스트가 정지돈을 경유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다. 인용과 질문과 아이러니로 가득 찬 이 지적인 책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 생각”하며 보내진 편지? 정지돈이 큐레이팅한 전방위 네트워크? 작가는 아마도 특유의 방식대로 응수할 것 같다. 제 소설 “전체를 통칭할 수 있는 말은 없고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니콜라 레). 무엇이라 부르든, 지나간 세기의 기록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현실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그의 접근 방식에 동참해보기에 적절한 연말이다. 『모든 것은 영원했다』 속 겪어본 적 없는 그리운 세계를 방 안에서 경험해보기 바란다.
라파엘 히슬로다에우스. “허튼소리를 퍼뜨리는 사람” 혹은 “무의미한 것에 박식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토마스 모어가 이 안내자의 설명과 함께 독자를 데려간 곳이 바로 「유토피아」였다. 무의미의 감각과 유토피아의 감각을 결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좀더 많아져야 한다. 내가 늘 신기해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인간이란 자기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에조차 그리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나는 그 능력이 인간다움을 측량하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고 싶다. 김수환(한국외대 교수, 러시아 문학 연구자)
.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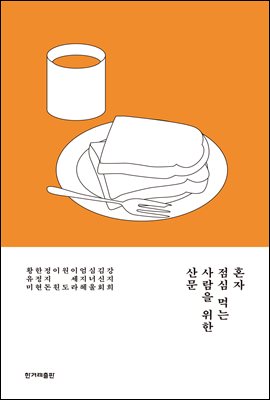


![[단독] 땅거미 질 때 샌디에이고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운전하며 소형 디지털 녹음기에 구술한, 막연히 LA/운전 시들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의 모음](/images/bookimg/41313983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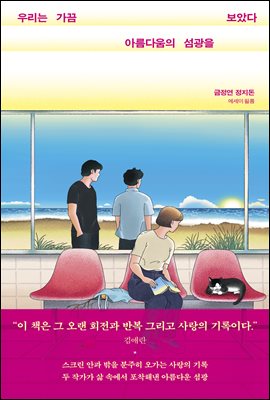




![[단독] 말은 안 되지만](/images/bookimg/4779045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