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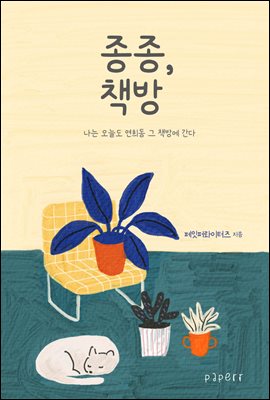
종종, 책방
- 저자
- 페잇퍼롸이터즈(paperr writers) 저자 저
- 출판사
- 페잇퍼
- 출판일
- 2023-12-01
- 등록일
- 2024-02-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61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무심코 자주 찾게 되는 공간에서
내 숨이 편안해지는 이유,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은 무엇일까?
프리랜서, 디자이너, 교사, 배우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책방을 기점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거주 지역이나 직업, 심지어 나이대도 다르다. 교집합이라면 이 책방이 전부다. 이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자신을 마주하고 싶어 꾸역꾸역 찾아올까? 질문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책방에 왜 오냐고?’ 질문은 단순했고 그래서 어려웠다. 고개를 갸웃하며 ‘좋아서?’, ‘그냥!’이라는 짧은 답이 속출했고 펜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질문은 여전히 거기 그대로였다. 그러자 무수한 삶의 장면들 속에서 실마리가 되는 순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되돌아보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자신을 살피고 있었다.
누군가는 라면이었다. 처음, 도망, 낙원, 회색지대, 사람, 유화, 유니버스 등 다양한 단어들이 그 뒤를 이었다. 단어를 따라 선을 그었다. 선은 삐뚤 빼뚤하고 모호했다. 그 삐뚜름과 모호함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었다. 그렇게 선은 지도가 되었고 그 지도를 따라가니 일상에서 마음껏 숨을 쉬지 못했던 순간들이 드러났다. 책방 문을 여는 순간 툭 내뱉던 안도의 한숨이 들리는 듯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어슴푸레 나를 반겼다.
종이는 동사형
우리는 책이다
종이는 틀림없이 명사다. 다른 언어로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 책방은 실제로 연희동 한 귀퉁이에 자리하고 있다. 책방의 이름은 ‘페잇퍼(paperr)’, 끝에 r이 하나 더 붙어있으니 굳이 읽자면 ‘페잇퍼어얼’ 이라고 할까? 책의 주재료인 종이를 간판 삼은 책방이라니, 색색의 다양한 질감을 지닌 종이가 수북한 틈새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기분이다. 매캐한 먼지 냄새만 가득할 것 같은데, 어쩐지 산뜻하다. 책방 문 안쪽에는 바깥과는 다른 공기 입자가 떠다닌다. 입자 하나하나가 품은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 책방을 찾는 사람들은 종이를 만지고 종이 위에 적힌 글을 읽고 종이에 글을 쓰거나 그림도 그린다. 종이를 교환하여 나눠 갖기도 하고 종이를 품에 가득 안고 문을 나서기도 한다. 움직이는 종이들, 그 종이에 살갗이 닿아 있는 사람들. 결국 모두가 종이였다. 그 종이들은 명사보다 동사에 가까웠다. 고정 불변할 것 같은 명사와 달리, 동사는 변화와 시간을 속성으로 지닌다. 책방도, 책방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종이의 동사형, 즉 모두 페잇퍼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고에 꽂힌 책을 꺼내 펼치면 숨죽여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글자와 그림들이 다채로운 의미로 번뜩이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내 몸은 여전히 빠듯한 현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만큼은 커다랗게 부푼다. 이야기 속으로 날아간다. 우리도 그렇다. 한 명 한 명이 살아온 삶과 품고 있는 이야기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모두가 책장에 주루룩 꽂혀 있는 책과 다름없다. 여기 사랑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당신을 만나러 온 16개의 이야기가 있다. 다정한 시선으로 들여다 봐주기를, 그리하여 잊고 있던 자신만의 순간들도 떠올려준다면 좋겠다. 당신이 결국 자신이라는 책을 펼쳐 자신만의 페잇퍼링을 하게 되기를 고대한다.
당신의 숨이 편안해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나는 오늘도 연희동 그 책방에 간다. 종종.
[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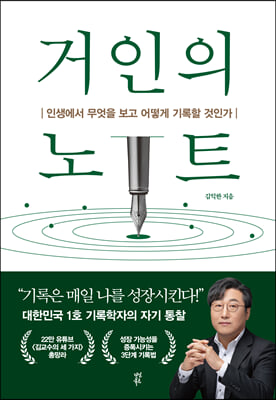

![[단독] 나는 왜 생각만 하고 그대로일까](/images/bookimg/5650489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