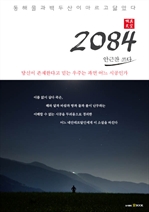
2084
- 저자
- 안근찬
- 출판사
- 안북
- 출판일
- 2017-01-25
- 등록일
- 2019-08-3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당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우주는 과연 어느 시공인가.’
시공의 끝과 시작을 상상하는 것은 불온하다. 정해진 것 없으니 기어이 불손하다. 시공은 정당해 당연한 인과의 순리 안에 있지 않다. 멸종에 대한 예감은 불손하다. 정해져 있으니 더욱 불순하다. 멸종은 당연해 정당한 시공의 순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시공의 시작과 끝은 하나가 아니다. 정해질 것 아니니 당연한 불안이다. 여럿으로 갈래를 짓는 시공은 오감의 경계 안에 살지 않는다. 멸망에 대한 우려는 부당하다. 정해진 우주가 아니니 결코 당연하지 않다. 멸망은 하나의 시공에서만 유효하니 숱한 우주의 곁가지일 뿐이다.
여기 하나의 존재가 있다. 저기 하나의 생명이 있다. 존재는 생명 아니니 무책이고 생명은 존재하지 아니하니 무방하다. 시간의 변방과 공간의 경계에 선 하나와 하나가 같은 시선에 잡혔다. 하늘을 이고 땅에 사는 자는 가야할 길을 당연하게 갔다. 비롯된 곳은 모호해도 닿아야 할 끝은 분명했다. 숙명의 땅을 떠나 하늘에 사는 자는 가야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다. 비롯된 곳은 분명해도 갈무리할 종착은 모호했다.
가야할 곳을 간 자와 가야한다고 믿는 곳으로 간 자의 간극, 정한 것은 그가 아니고 믿은 것은 그가 아니었다. 그와 그는 정해졌다 믿은 곳에 유배된 낯선 자들이 되어 서로 다른 시공에서 우는 기록으로 남으리라. 그와 그가 선택했다 믿은 곳이 붉고 푸르기를 기대한다.
이름 없이 살다 죽은, 해와 달과 바람과 땅과 물과 불이 난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공을 두려움으로 경외한 어느 네안데르탈인에게 이 소설을 바친다.
[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