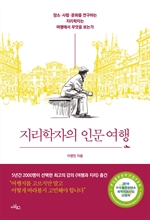살갗 아래
- 저자
- 토머스 린치 외
- 출판사
- 아날로그
- 출판일
- 2020-02-24
- 등록일
- 2020-04-1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몸을 들여다본다는 것, 지나온 생을 되돌아보는 일
“세월은 우리 몸 곳곳에 상흔을 남긴다”
사람들은 자기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얼마나 자주 생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가장 복잡한 구조물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활동을 하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까지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 눈에 작은 티끌이 하나 들어가거나 손톱 밑에 가시라도 박히는 날이면 온몸의 신경이 그곳에 집중된다. 흔히 육체보다 정신을 더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과연 그 둘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인간의 몸에 관한 에세이다. 살갗 아래에 있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창자, 폐, 콩팥, 심장 같은 인체 장기들을 주제로 한다. 뭉뚱그려 ‘몸’이라고 표현되지만, 제각각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는 낱낱의 기관들도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 몸으로 세월을 견뎌낸다는 의미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의 흔적은 우리 몸 곳곳에 흔적을 남긴다. 열다섯 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열다섯 개 기관에 깃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소설가, 시인, 오페라 대본가 등 열다섯 명의 작가들이 들려주는
몸속 기관들에 관한 가장 아름답고도 독창적인 이야기
이 책에는 소설가, 시인, 칼럼니스트, 오페라 작가, 스탠드업 코미디 작가 등이 각자의 경험과 사색, 역사, 문학, 의학 등을 한데 엮어 아름답게 풀어낸 열다섯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나오미 앨더먼은 소화기관과 음식 강박에 대해, A. L. 케네디는 뇌보다 먼저 기억을 불러내는 코의 놀라운 능력을, 아비 커티스는 시력과 세상을 인지하는 방법에 관해 말한다. 이들 외에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깊이 녹아들어 있는 경우도 있다. 부모님이 HIV에 감염되어 돌아가신 잠비아 출신의 시인 카요 칭고니이는 혈액, 크론병을 앓고 있는 윌리엄 파인스는 대장, 천식발작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 달지트 나그라는 폐에 관해 각자의 경험을 들려주며, 그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무지를 함께 이야기한다. 특히 작가이자 장의사인 토머스 린치는 삶과 죽음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으로 기적 같은 자궁 이야기를 담아낸다.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