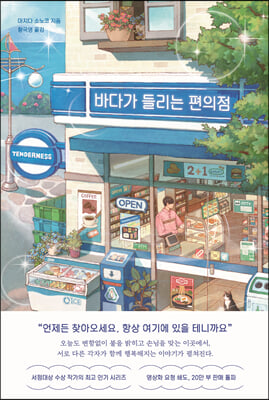상세정보

야수가 나타났다
- 저자
- 이기린
- 출판사
- 시크릿e북
- 출판일
- 2014-02-21
- 등록일
- 2014-06-0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같이 산에 좀 올라갑시다.”
“이, 이 사람이 근데 점점. 내가 왜 댁이랑 산을 올라요?”
“왜요? 설마 내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겠죠? 이 순경.”
“하!”
지헌이 약을 조금 올리며 비웃는 척하자, 나운은 단박에 화르르 해서 그의 차에 답싹 올라앉았다.
‘단순하기는.’
그는 조수석에 앉아 가재미눈을 하고 그를 째려보는 나운의 시선을 모르는 척하고 칠복산 중턱으로 차를 몰았다. 차는 한참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다 길이 끝나는 약수터에서 멈추었다. 말이 약수터이지 맑은 개울물이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굳이 이곳까지 와서 물을 뜨는 주민은 없었다. 흔적만 남은 약수터에는 녹이 슨 운동기구 몇 개만 처량하게 놓여 있었다. 나운은 쭈뼛거리며 공터로 내려섰다.
“여기는 왜요?”
“뭘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이런 산 속에서 알아볼 게 뭐가 있는데요?”
그는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나운은 지금 무지무지 수상하다는 말을 온 얼굴로 표현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거 이 남자, 조폭이 아니라 혹시 간첩 아냐? 남의 동네 산에는 왜 이리 관심이 많은데?’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