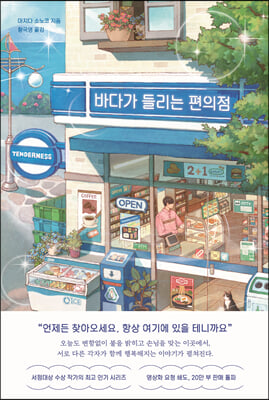이별 직전에 살고 있다 1
- 저자
- 이삼순
- 출판사
- 라떼북
- 출판일
- 2013-04-02
- 등록일
- 2013-07-2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저기, 어제 내가…….”
“됐어! 난 괜찮으니까 마음 쓸 거 없고 빨리 출근 준비나 해!”
“저기, 괜찮다니 뭐가?”
묵묵부답. 난 녀석의 목소리가 내 손을 떠난 지도 모르고 휴대폰을 부여잡고 있었다.
뭐야? 지 말만 하고 끊은 거야? 끊을 때 끊더라도 알려주고는 끊어야 할 거 아냐. 지는 괜찮고 난 마음 쓸 거 없는 일이란 게 뭔지, 아니 그 전에 연장자에게 야, 너, 하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그나저나 부탁하지도 않은 모닝콜은 또 뭐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황당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다. 그 황당함은 어제의 기억을 더듬게 만들었다. 그래, 어젯밤 술을 마신 것까진 알겠다. 내 앞에 놓였던 술병이 내 주량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도 알겠다. 녀석이 취한 나를 업고 택시를 잡았다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그 다음 기억부턴 조금씩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마치 중경삼림의 왕가위 감독이 내 기억을 연출하고 있기라도 하듯 화면이 흔들거린다. 날 바라보는 녀석의 눈빛이 흔들거리고, 택시기사아저씨의 무심한 뒤통수가 흔들거리고, 알코올로 범벅된 위장이 흔들거린다. 그러다 화면이 새까매진다. 이 바닥 용어로 페이드아웃.
하지만 단언컨대 그건 아니다. 연상녀와 연하남이 취중에 침대에서 함께 뒹굴다가 다음날 서로간의 반말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이차를 초월한 연인이 되었더라, 는 뻔―한 스토리 말이다.
기억도 없다면서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고? 자, 보시라!
- 본문 중에서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