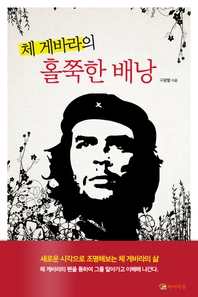상세정보

들어라 청년들아
- 저자
- 정과리
- 출판사
- 마이디팟
- 출판일
- 2014-03-25
- 등록일
- 2014-06-0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MB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삶은 살 만한 것인가?”
한때 새길 말을 가졌던가? 글을 놓은 지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것처럼 모든 것이 가물가물하다. 내가 글을 사랑했던 것은 분명하다. 삶을 증오했던 것처럼. 그러나 내가 글을 증오했던 것도 분명하다. 삶에 집착했던 것처럼. 나는 글을 지나쳐 어느 풍경 앞에 와 있는 듯하다. 지독한 한발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의 풍경. 그 사이를 누런 개 한 마리가 혀를 길게 빼물고 폭염의 아지랑이 사이를 비집고 지나간다. 그리고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냉랭한 뱀 한 마리가 개가 연 길을 수직으로 가르며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적막한 빗금들 사이로 새나오는 한 목소리를 듣는 건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삶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 ‘들어라 청년들아’ 중에서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