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직 밤뿐인
- 저자
- 존 윌리엄스
- 출판사
- 구픽
- 출판일
- 2020-02-29
- 등록일
- 2020-04-29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스토너』『아우구스투스』 작가 존 윌리엄스가 전쟁 참전 중 초고를 완성한 소설 데뷔작
거장의 위대한 작품 탄생 이전, 20대 청년 작가의 문학적 호기심과 넘치는 에너지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
『스토너』, 『아우구스투스』의 작가 존 윌리엄스의 전혀 결이 다른 이 데뷔작은 먼저 출간된 그의 작품을 읽은 독자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작가의 작품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1942년 공군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존 윌리엄스가 전쟁 중 부상을 입고 회복하는 상태에서 지루함을 떨치기 위해 써내려 간 『오직 밤뿐인』은 그의 이후 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20대 청년만의 열정적인 에너지와 실험정신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소설이다. 안타깝게도 작가 본인은 데뷔작을 좋아하지 않아 절판된 이후로는 이 작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출간 50년 만에 『스토너』가 주목받은 후 작가의 전작(全作)에 대한 관심이 열광적으로 높아지면서 2019년 초 원서 출판사인 뉴욕리뷰북 클래식(NYRB Classics)은 『오직 밤뿐인』까지 복간하였다.
대도시 호텔에 머물면서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는 예민하고도 무기력한 청년 아서 맥슬리. 아무 감정의 기복도 없어 보이는 아서의 내면은 사실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휩싸여 있고 남들은 보지 못하는 환상에 시달리며 괴로워한다. 경멸하는 친구와의 짧은 만남 후 한참 동안 연락이 없었던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혐오와 그리움을 동시에 느끼는 아서. 감정의 극단에 이른 아서의 짧고도 긴 하루를 쫓는 음울한 환상의 심리소설.
인간과 세계의 불확실성과 부조리를 주로 다룬 실존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은 존 윌리엄스의 데뷔작은 인생 초기의 심리적 외상이 평생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한다. 주인공 아서 맥슬리의 하루가 전체 200페이지 남짓의 짧은 분량에 담긴 소설이지만 그 묘사는 마치 그의 일생을 훑는 듯 세밀하고 자세하다. 그는 왜 우울한 환상에 시달리는 것이며, 혐오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아버지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신과 세상을 미워하면서도 내심 애정을 갈구하는, 좋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전히 미워할 수도 없는 아서는 어쩌면 전쟁 한가운데에서 외상을 입고 외따로 떨어진 젊은 작가의 우울한 심리를 투영한 것일지도 모른다.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힘든 난해한 장면들 속에서도 그 미세한 관찰력에 현장감과 박진감까지 느껴지는 건 이십 대부터 뛰어났던 작가의 깊이 있는 필력 덕분이다. 한 페이지를 달걀 프라이 묘사에만 할애한 장면(“노란색 눈알이 그를 맞받아 볼수록 몹시 불편해졌다…미끈대는 흰색 구체에서 노란색 눈동자가 아직도 그를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이나 근 두 페이지를 날아오는 주먹만 묘사한 부분도(“그는 거대한 망치 같은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팔 전체가 마치 미숙한 조각가가 서둘러 새긴 대리석 기둥처럼 될 때까지 손목에서부터 근육이 불룩해지는 것을 보았다.”) 『오직 밤뿐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데뷔작의 매력이다.
재미있는 발견은 1948년부터 1972년 동안 총 네 편의 소설만 발표한 존 윌리엄스 소설을 꿰뚫는 공통점과 차별성이다. 네 편의 소설 모두 인생의 변곡점을 겪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데뷔작 『오직 밤뿐인』이 오로지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짧은 이야기를 다룬 반면, 그로부터 12년 후 발표한 두 번째 소설 『도살자의 건널목』은 몇 달 동안의 경험을 다루고 있으며, 1965년과 1972년 출간된 『스토너』와 『아우구스투스』는 한 남자의 일평생을 서술했다는 것. 30여 년 동안 확장되는 인생의 경험을 작가의 눈으로 표현한 것만 같다. 도서 말미에 실린 존 윌리엄스의 부인 낸시 가드너 윌리엄스와의 인터뷰는 『오직 밤뿐인』뿐만이 아닌, 작가와 그의 작품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 작가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관찰한 부인의 애정 어린 시선을 통해 기존에 미처 알지 못했던 작가와 작품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온다. 존 윌리엄스가 처음으로 주목받은 장편소설이자 마지막 미번역작인 『도살자의 건널목』은 2020년 하반기 구픽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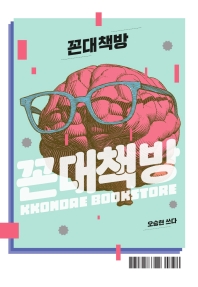

![[단독] 스토너 초판본](/images/bookimg/3069789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