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시베리아 방랑기
- 저자
- 백신애 저
- 출판사
- 포르투나
- 출판일
- 2020-11-12
- 등록일
- 2023-01-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0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나는 어렸을 때 ‘쟘’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구쟁이 오빠는 언제나 “야 잠자리!”하고 나를 불렀다. 호리호리한 폼에 눈만 몹시 컸기 때문에 불린 별명이었다.
나는 속이 상했지만 오빠한테 싸움을 걸 수도 없어서 혼자 구석에서 홀짝홀짝 울곤 했다.
울고 있으면 어머니는 또 울보라고 놀리셔서 점점 더 옥생각하여 하루 종일 홀짝거리며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다. 그러다 심심해지면 벽에다 손가락으로 낙서를 하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했다.
내가 홀짝거리던 그 구석 벽에는 세계지도가 붙어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홀짝홀짝 울 때면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 지도 위에 선을 그으며 ‘여기는 미국! 우리 집은 이런 데 있구나!’하며 혼자 재미있어 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러시아를 가리키며
“여기는 북극이라 사람이 살 수 없단다. 낮에도 어두컴컴하지. 그리고 오로라를 볼 수 있단다.”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북극, 오로라, 낮에도 어둡다, 라는 말에 ‘어머! 멋있는 나라겠다.’라고 생각했다. 십삼 세 소녀의 꿈은 끝없이 펼쳐졌다. 그 때부터 나의 홀짝홀짝 구석에 붙어 있는 세계지도는 내 생활의 전부인 듯이 생각되었다. 북극, 오로라만이 아니라 레나 강도 찾아내었고 바이칼 호도 우랄 산도 나의 아름다운 꿈속에서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언젠가 꼭 레나 강에 조각배를 띄우고 강변에는 자작나무로 된 통나무집을 짓고 눈이 하얗게 덮인 설원을 걸으며 아름다운 오로라를 바라볼거야! 그리고 초라한 방랑시인이 되어 우랄 산을 넘을 땐 새빨간 보석 루비를 찾아 볼가의 뱃노래를 멀리서 들을 거야.”
라는 뱃노래를 멀리서 듣는다. 내 머릿속은 공상의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나 같은 울보 잠자리가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꿈에 젖었는지 조금 이상하다. 정말로 나는 이상한 여자애였다.
이 이상한 여자애에게도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쌓여 열아홉 살의 봄을, 아니 열아홉 살의 가을을 맞이했다.
드디어 찬스가 왔다. 감상의 오랜 꿈은 빨간 열매로 익어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든 소녀 여행자가 된 것이다.
[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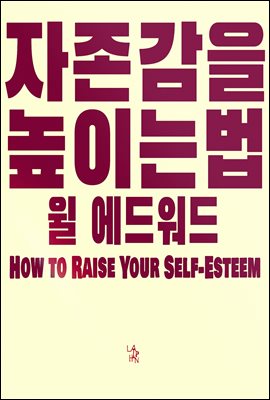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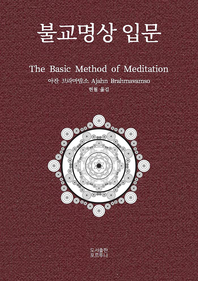

![[오디오북] 한국대표중단편문학 - 낙오](/images/bookimg/BC/15040096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