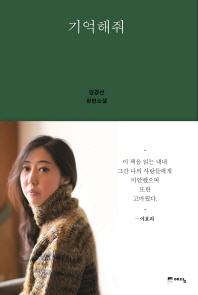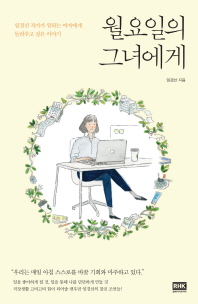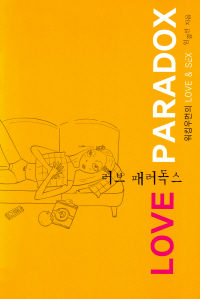하루키와 노르웨이 숲을 걷다
- 저자
- 임경선
- 출판사
- 퍼플
- 출판일
- 2013-10-31
- 등록일
- 2014-06-0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교보문고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열다섯에 무라카미 하루키를 만나다
카프카 소년이 열다섯 살에 가출을 했다면, 열다섯 살의 나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만났다.
나는 열다섯 살 때, 일본의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곳은 소위 재일교포들을 위한 민족학교로서, 모든 것을 일본어로 가르치되 한국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더불어 가르치는 곳이었다. 어렸을 때는 일본에 살았지만 여러 나라를 거쳐 떠돌이생활을 했던 나는, 일본 고등학교로 전학 갔을 때 다시 어렵게 일본어를 익혀야만 했었다. 힘들었지만 팔자려니 했다.
전학을 간 학교는 ‘민단(남한)’ 계열 학교였지만, ‘조총련(북한)’ 계열의 아이들도 더러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자전거 통학 시에는 부근의 조총련 학교에 다니는 치마저고리 교복 차림의 북한 아이들을 곧잘 마주치곤 했다. 서로를 의식하지만 그냥 지나치는 그런 관계. 무서웠냐고? 그곳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었다. 그저 우리 학교의 경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때 ‘조총련’ 계열 학생들의 입국이 허락되지 않아서 같이 못 갔던 아쉬움이 있을 정도.
교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머리에 리본을 매고 삼각함수, 미적분과 씨름하던 1987년, 즉 건방진 열다섯 살의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우연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노르웨이의 숲)》를 읽게 되었다. 새빨간 책이라 부모님 몰래 매일 밤 조금씩 나눠서 읽었다. 애틋한 정사장면이 나오면 무척 부끄러워 아랫배가 간질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하루키의 글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흘러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대학을 가서 연애를 했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척을 했고, 직장에 다니며 인간과 일을 알게 되었고,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의 맹세를 했고, 지금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엄마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20년 사이에 일어났던 무수히 많은 일들도 지금은 형체가 없는 아지랑이처럼 아련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모든 슬프고 힘들고 기쁘고 먹먹했던 세월을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로 위로받고 지탱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나는 대체적으로 싱겁고 건조한 사람이라서 뭔가에 깊게 푹 빠지거나 미친 듯이 매달리거나 수집을 하는 것과는 별로 인연이 없이 살아왔다. 게다가 무엇에든 쉽게 질리는, 변덕이 아주 심한 사람이다. 다만 불가사의하게도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에 대해서만은 이날 이때까지 깊이 매료되어 왔다. 그것은 오로지 그가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꾸준히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글을 써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속 깊이 고마웠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를 기리며 책을 쓰는 것밖에는 없었다.
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는 ‘그저 그래야 될 것 같았고 또 너무나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라고 대답할 것이다.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 인생의 당연한 수순이었다.
2006년 가을
《하루키와 노르웨이 숲을 걷다》의 출간을 기다리며
임경선
- 본문 프롤로그 중
[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