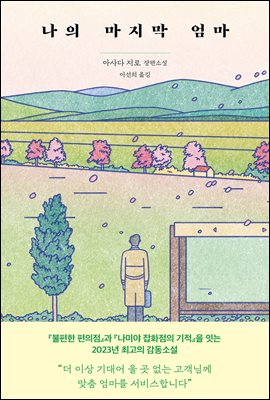나는 발굴지에 있었다
- 저자
- 허수경
- 출판사
- 난다
- 출판일
- 2019-03-05
- 등록일
- 2019-03-26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무덤을 열고 들어가 나 스스로 죽음이 되어 쓴 책!”
허수경 시인의 산문집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를 펴냅니다. ‘바빌론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진 이 책은 지난 2005년 9월 출간된 바 있는 저자의 책 『모래도시를 찾아서』의 개정판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3일 독일 뮌스터에서 세상을 뜬 시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이 책은 오리엔트의 페허 도시 바빌론을 중심으로 고대 건축물들을 발굴하는 과정 속에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권의 고고학 에세이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죽음’을 붙잡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있다 없어진 일, 지금에 와 없는 자는 말이 없고 있는 자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일, 그것이 죽음이라 할 때 시인은 다분히 그 상징성을 띤 발굴터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일에 능동성을 책임으로 가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총 17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전 인류의 역사를 막론하고 흔적을 남기고 싶어한, 불멸을 탐한 인간 욕망의 부질없음을 탓하곤 하는 시인만의 날카로운 통찰을 배울 수 있어 일견 숙연하게도 만듭니다. 서로를 죽이고 죽이지 못해 안달인 인간만의 정복과 찬탈의 역사로 파괴와 파괴를 거듭한 증거인 유적들을 통해 어떤 소용의 무용에 대해서도 가르침 없이 그저 보여줌의 묘사로 어떤 깨달음을 줍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역사적 발굴 현장에서 근원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토로합니다. 모래먼지 속에 모래먼지가 될 제 운명을 예견이나 했다는 듯, 차곡차곡 제 죽음의 당위성을 미리 써두기나 했다는 듯이 발굴터에서 써나간 이 아픈 기록들은 시인의 유서로도 읽히기에 충분합니다.
“수없이 파괴당했던 바빌론, 누가 그곳을 그렇게 수없이 다시 건설하는가”라는 브레히트의 말은 “발굴을 하는 자에게 폐허 도시는 잊힌 도시가 아니다. 자신의 환상 속에서 움직이고 자신을 구속하는 살아 있는 현재이다”라고 한 시인의 말과 일견 겹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인은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과거를 발굴하는 일을 왜, 하는가, 라고 동아시아인은 스스로에게” 묻기를 반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이 그곳에 살았고, 잊혔고, 그리고 현재 속으로 다시 불려졌는가!” 수없이 메모를 남깁니다. “어떤 대륙도 주인을 가지지 않았는데, 누구도 어떤 한 뼘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는데……”
죽은 자의 휴식을 정말,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럴 운명 속의 시인은 대신 그 발굴터에서 만나게 된 철기 시대의 무덤 속 한 소년과 한나절을 보내기도 하면서 “마치 산 사람과 터놓고 지내는 것처럼 그와 터놓고, 그 철기 시대의 한 저잣거리에서 일어난 이야기 가은 걸 나누고 싶어”합니다. 무덤을 발굴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상황 속의 시인은 고고학자와 시인이라는 운명 가운데 후자가 제게 더 맞다는 것을 깨닫고는 합니다. 이 책의 일견이 되려 시론으로 읽히기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시로 향하는 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토로해가는 그녀의 자문자답 속에 시의 나침반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냄새’로 맡아지는, 규명할 수 없는 어떤 ‘훈기’로 알아채야 하는 조짐 같은 게 시라 할 때, 그 뒤안에서 시를 되새기는 이런 대목을 보고 있자면요.
“이 소년의 뼈와 해골을 분석해서 철기인들에 대한 정보가 담긴 자료를 좀더 보태는 것이, 사실 고고학 현장 작업을 하던 그때 나의 숙제였는데, 그 숙제를 끙끙거리고 하면서도 나는 내 숙제라는 것이 이 소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일 내가 죽어 몇천 년 뒤에 이렇게 발굴이 된다면 그 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해 아래로 드러난 그에게서는, 그의 손 가까이에 놓여 있던 종지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의 어미였을까, 그에게 곡식과 대추가 담긴 종지를 놓아둔 이는. 종지 안에서 돌처럼 굳은 곡식알과 대추씨를 작은 구멍을 낸 비닐포장지에 담았다. 고식물학을 하는 이가 실험실에서 이 곡식알과 대추씨를 분석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 곡식알이 밀알인지 보리알인지 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냄새는.
휴일, 아무도 없는 폐허지를 산책하다가 그늘에 앉아 물을 마시며 내가 판 텅 빈 무덤을 바라보노라면, 글쎄, 그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냄새가 있고 없고를 넘어 다정하게 어깨를 겯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 쓸쓸한 것은 어떤 실험실도 내가 기억하는, 유럽인들이 시암바질이라고 부르는 방앗잎의 냄새를 뼈에서 찾아낼 수 없을 거라는 것, 살아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즐겁다는 것도. 혹은 죽은 뒤가 되면 어떨까, 물고깃국을 함께 먹던 식구들의 그 등을 나는 기억할까. 아마도, 저 돌처럼 딱딱해진 곡식알과 대추씨처럼, 그렇게.”
-119~200쪽
시인이 떠난 이후 시인의 사십구재에 맞춰 출간된 이 산문집은 허수경이라는 사람의 인생 앨범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려 기억을 타고 올라가던 고백에서, 고향을 떠나와 독일에서 두번째 생의 짐을 부려놓는 나날의 아픈 대목에서,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더라 고한 발굴지에서 “마치 폐허를 몸소 살고 있는 것같이, 고요했고 허탈”한 표정을 짓곤 하던 대목에서,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시집들은 김치 중독자들이 밥 먹을 때 김치를 꼭 챙기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에 속한다”며 백석의 시집을 읽고 또 읽는 대목에서, 나아가 “거대 정치가 짓이겨버린 순간들이 나즉나즉 모여들어 이 지상에서 말의 한 우주로 만들 때” 그 우주를 엿볼 수 있는 시인들에게 평안을 비는 대목에서, 우리는 허수경이라는 한 시인이자 한 여성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안 듯한 안도에 순간 심장의 뜨거운 피돎으로 울컥거리게도 돕니다.
그러나저러나 시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허수경이라는 시인, 저만이 할 수 있는 뜨거운 제 솜씨의 음식을 우리들 토기에 퍼준 것까지는 받아들어 알겠는데 지금 허수경이라는 시인, 저만이 쓸 수 있는 언어의 토기는 여기에 두고 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간 걸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png)